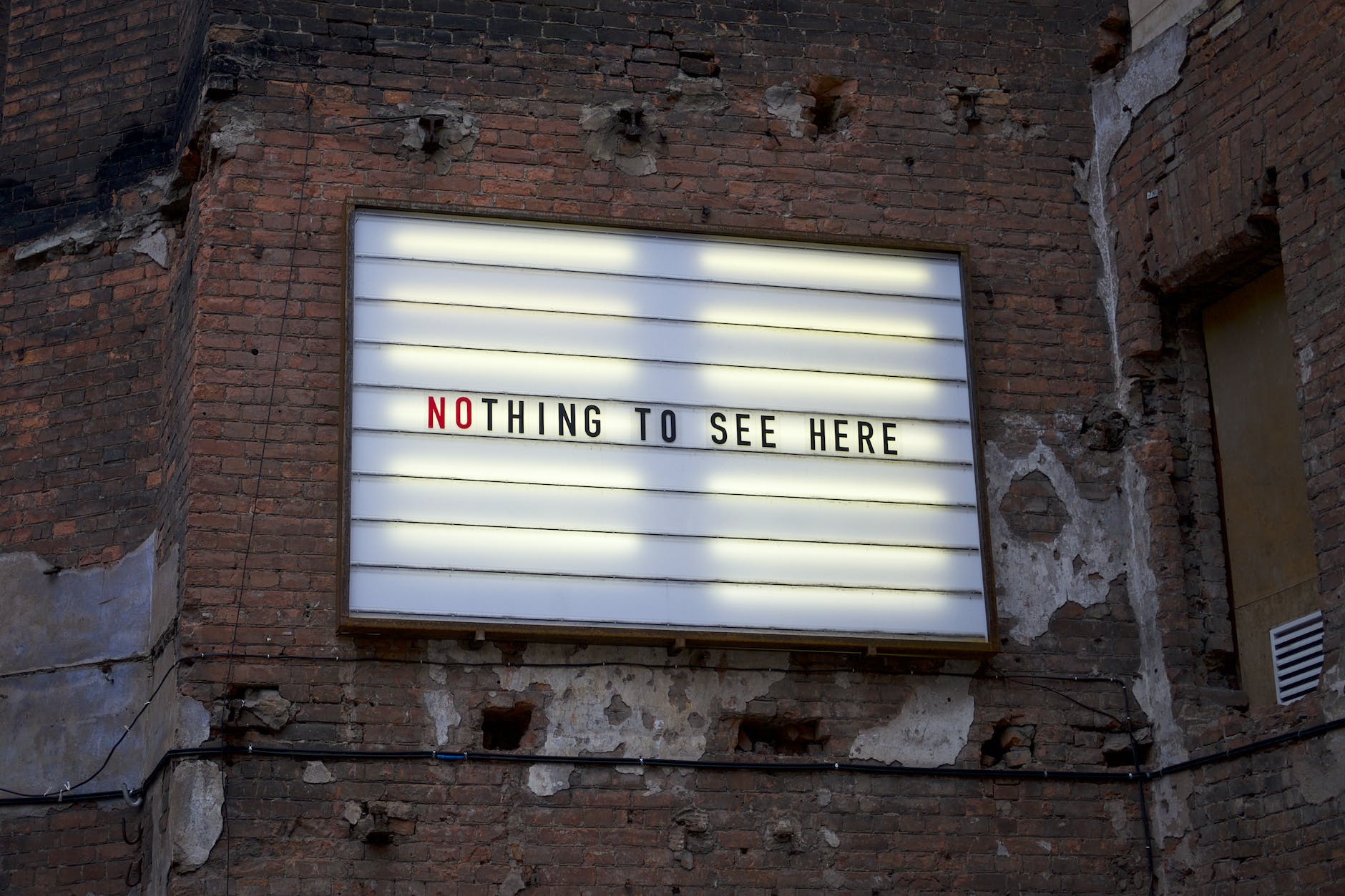- 누구의 일기인가
일기의 문제는 누구의 일기인지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선, 지암일기의 경우는 지암(支菴) 윤이후(尹爾厚)다. 이가 누군지 알아보자. 윤이후는 1636년에 태어나 169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선도(尹善道)의 손자이며 윤선도의 둘째 아들 윤의미(尹義美)의 둘째 아들이다. 그의 아들 윤두서에 따르면 “윤이후가 태어나기 10일 전, 부친이 사망하고, 태어난 지 5일 만에 모친 또한 절식(絶食) 끝에 남편을 따라 사망했다. 그래서 할머니인 윤선도의 처 남원윤씨(南原尹氏) 아래에서 성장했다.” 1679년인 숙종 5년, 44세의 나이에 생원(生員)이 됐고, 1689년인 숙종 15년, 54세의 나이로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했다. 그 후, 성균관 전적, 병조 정랑, 선혜청 낭청, 사간원 정언 등을 거쳐 1691년, 숙종 17년에 외직으로 나가 함평 현감을 1년 정도 역임하다 1692년 3월 영암 옥천으로 낙향했다. 이후,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서 생활하다 1699년 숙종 25년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살펴 보면, 『지암일기(支菴日記)』는 함평 현감에 재직하던 임신년(숙종 18년, 1월 1일)부터 관직에서 물러난 후 향촌에서 생활한 시기에 매일 기록해, 기묘년(숙종 25년, 9월 9일)까지 작성한 사적事跡이며, 매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기체 책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지암일기』는 “매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며, “저술과 시문”을 포함한다(김경숙, 2015: 149쪽). 형태는 필사본(筆寫本)이며, 총 3책(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암일기(支菴日記)』를 다룬 기존 연구는 정윤섭(2012)의 「16, 17세기 해남윤씨의 화산((花山) 죽도(竹島) 해언전(海堰田) 개간: 윤이후의 『지암일기』를 중심으로」(『역사학연구』46)가 있고, 김경숙(2015)의 「17세기말 향촌 사대부의 생활과 여행」(『한국문화』 71)와 문숙자(2016)의 「고문서로 본 조선후기 양반가의 가사(家舍) 경영과 주거(住居): 해남윤씨 윤선도 가계의 사례를 통하여」(『정신문화연구』145) 등이 있다.
이 일기를 읽어나가면 “-이(-가) 왔다”라는 말이 참 많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왔다”거나 그저 “(누가) 왔다”는 말이 잦은 편이다. 이래서인지, 당시 일기의 특징은 말 그대로 사태의 기록이거나 ‘집적’(集積)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것은 누구인가. 당연히 글을 아는 자이며, ‘일’을 관장(管掌)하거나 (일하지 않고) 목도(目睹)하는 위치에 속한 자들, 바로 양반. 사림(士林)에 속한 자들이다. 이들 신분은 어느만큼의 ‘조선’일까. 그들의 “목도”는 조선시대의 사생활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내는 건, 어떤 조선인건가. 가령, 이를 “일상사”혹은 “미시사”가 가진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응한다고 볼 수 있을까?
- 조선시대의 일기는 현재의 일기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조선시대 일기의 자료적 성격에 관한 글은 몇 편이 있다. 예컨대, 『정신문화연구』 65호(1996년 12월, 출처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056954)에 실린 “조선조 ‘일기’류 자료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기획은 일기(日記)에 관한 사적(史的) 검토를 탐색한 기획으로 보인다.
우선, 서구에서 일기를 다루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연대기적 글쓰기다. 예컨대 16세기에 들어와 세계사를 365일로 구분해 하루 단위로 기록하는 연감 형식을 가진 글을 말한다. 둘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록이다. 18세기에 들어, “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내면을 토로하는 장소로서의 일기”라는 점이다. 편지와 달리, 원칙적으로 수신자가 없으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서 셋째, (여러 글쓰기 유형 가운데) 가장 진정성이 있는 글쓰기 형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애매한 특징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일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정구복은 일기는 ‘일록(日錄)’, ‘잡록(雜錄)’, ‘__錄’‘이란 명칭을 주로 갖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연/월/일”이 적힌 것들을 일기로 통칭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내용을 통해 구분”하자 제안한다. 조선시대 일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날 그날 기록했다‘는 ”즉시성(卽時性)“,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현장성“, 개인의 기록이라는 점의 ”사적(私的) 특수성“, 허위진술이 없다는 점에서 ”진솔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기는 상세하고 구체적이라 역사 실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파악한다.
그러나 서구 일기의 “연대기성”, “주관성”, “진정성”과 (정구복이 말하는) 조선 일기의 “즉시성”, “현장성”, “사적 특수성”, “진솔성”은 유사해보이나 꽤 다르다. 공통점은 “매일 매일 기록”, 혹은 “그날그날의 기록”이라지만, “주관성”과 “현장성”의 간극은 크다. “현장성”의 강조는 서구 근대의 ‘일기’와 다른 양상을 띄며, 앞서 사적(事績)이며, 한국사학계에서 일기를 1차 사료로 포함하려는 설정에 의해 강조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일기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예컨대, 『승정원 일기』는 일기(日記)로 보아야 하는가? 이 ‘연대기성’과 ‘즉시성’과 같이 기록하는 ‘시간’의 성격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는 범주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가령, 조선의 ‘일기’는, 일기 하위에 몇몇의 분류를 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구복(1996)은 생산주체에 따라 “공적인 일기”와 “사적인 일기: 생활일기/특수일기”로 나눴다. 염정섭(1997)은 “필자의 성격”과 “내용의 성격” 등을(2007) 기준으로 “생활일기, 사환일기, 전란일기, 관청일기, 여행일기, 사건일기” 등으로 나눴다. 게다가 황위주는 “관청”, 서원/향고/영당, 묘소/묘비 관련 등의 “공동체”, “개인”의 생활일기 등으로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사학계의 주된 시점인 “사안의 발생시점” 가까이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기’라고 부르는 ‘개인의 (내밀한) 속사정’을 담은 (어쩌다가 공개된) 글과는 다르다. 즉, 조선시기 일기의 분류만을 놓고 볼 때, 현재의 일기와 당대의 일기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일기(日記)라고 불렀을지, 여기 지금의 우리는 (당대의) 무엇을 일기로 불러야 할지 정립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 단일한 자료군은 아닌 셈이다.
일기라는 기록은 일상사(日常史)에 있어, 역사와 개인 기억의 빈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일까? 그 가능성은 사료로서의 일기에 역할이 아니라, 일기를 세세히 분류하야 다룰 것과 다루지 않을 것을 분류하는데 있다. 게다가, 일기는 무조건 믿기엔 어렵다. 그러므로 일기를 상대로 하는 연구란, 항상 글 뿐 아니라 그 글이 대변하는 인물과 마주하는 사적이며 내밀한 ‘현장’에서 이뤄진다. 마치 참여관찰에서 구술자를 대하듯, 글을 읽으며 항상 의심해야 한다. 일종의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 실상’이라는 덫
일기는 실상(實狀)을 밝히는 자료인가? 서구의 authenticity와 정구복의 “진솔성”은 다르다. 정구복의 진솔성에 대한 설명은 “허위진술이 없다”는데 그친다. 서구의 authenticity와 대면하지 않더라도, 즉, 사료로서의 (조선시대) 일기(日記)는 ‘허위진술’이 없는 사료인가? 정구복이 말하는 “진솔성”은 일종의 기대다. 서구의 ‘일기’를 기준에 두고, 으레 그랬을 것이라 어설피 생각한 ‘기대’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일기를 두고 정보의 집적(集積)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한다면, 이는 ‘진솔한’ 개인의 사정(事情)보다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셈’한 장부(帳簿)를 작성한 성격은 아닐까? 예컨대, 19세기의 『하재일기』(荷齋日記)에서 거래와 돈의 이야기가 자주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진솔함 혹은 진실함의 문제는 다르다. 그저, 개인이 활동하고 인식한 경험과 그 범위에 기초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건 아닐까?. “체험과 인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얼핏 보기에 (『지암일기』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일기는 ‘너무나 점잖으며 깨끗하다.’ 한탄스러운 일은 “일꾼들에게 줄 술이 이미 소진되어 먹일 수 없는” (11쪽) 이라거나 안타까운 일은 “(수문을) 돌로 쌓지 못한” 점이다(12쪽). 혹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위로하려는 뜻”으로 “공사가 끝난 후”(남은 쌀로 ) “술을 빚어 하루 놀게 했다”(12쪽) 는 식으로 개인의 ‘견해’가 드러나는데, 이는 진솔한 것일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에서 공개한 자료로, 1960년 2월 14일과 15일, 18일에 쓰인 마산 지역의 이름모를 고등학생의 일기다. 1960년 3.15 선거와 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전후 분위기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출처: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434355) .
학교에 등교한 모양인데, 아침부터 “이(승만) 대통령 각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다고 한다. “이것도 선거의 일종이 아닐까” 의심하며, 당시 집권당인 ‘간신’과 자유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ᅠ게다가 이 날은 조병옥이 사망한 날이다.ᅠ”장말로 진실한 애국자이신 조박사. 그대도 이젠 가시었으니 나라에 나라에 유명한 영도자를 한 사람 잃었도다”라며, 그 죽음을 기린다. 이 말은 단지 죽은 자에 대한 형식상의 추도로 읽어내기 힘들다. “이젠 자유당 일당정치로 되지 않을까? 정치는 영구히 부패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아이구 될되로 되어라. 자유당이여 당신네들은 이젠 야망을 채울 것이다.”라며 당대 자유당이 집권한 상태인 국내 정치에 대해 걱정하고 분노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심정도 허전했다”는 문장으로 이름없는 글쓴이의 실망을 알 수 있다.이 이름모를 학생은 펜을 꾹-꾹 눌러 큰 글자체로 “조병옥 박사(철학, 경제학 박사)”라 적었다. 사람들이 느낀 당대 이뤄진 정치에 대한 허무의 표시는 아닐까. 일기는 행위와 느낌의 기록을 넘어선다. 구석의 낙서나 두껍거나 큰 글씨체, 특별한 표시 등의 사소한 것들로 마음을 세세히 살필 수 있다. (이 점에서 육필 일기는 인쇄된 자료와 다르다!) 그렇기에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살필 수 있는 흔적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