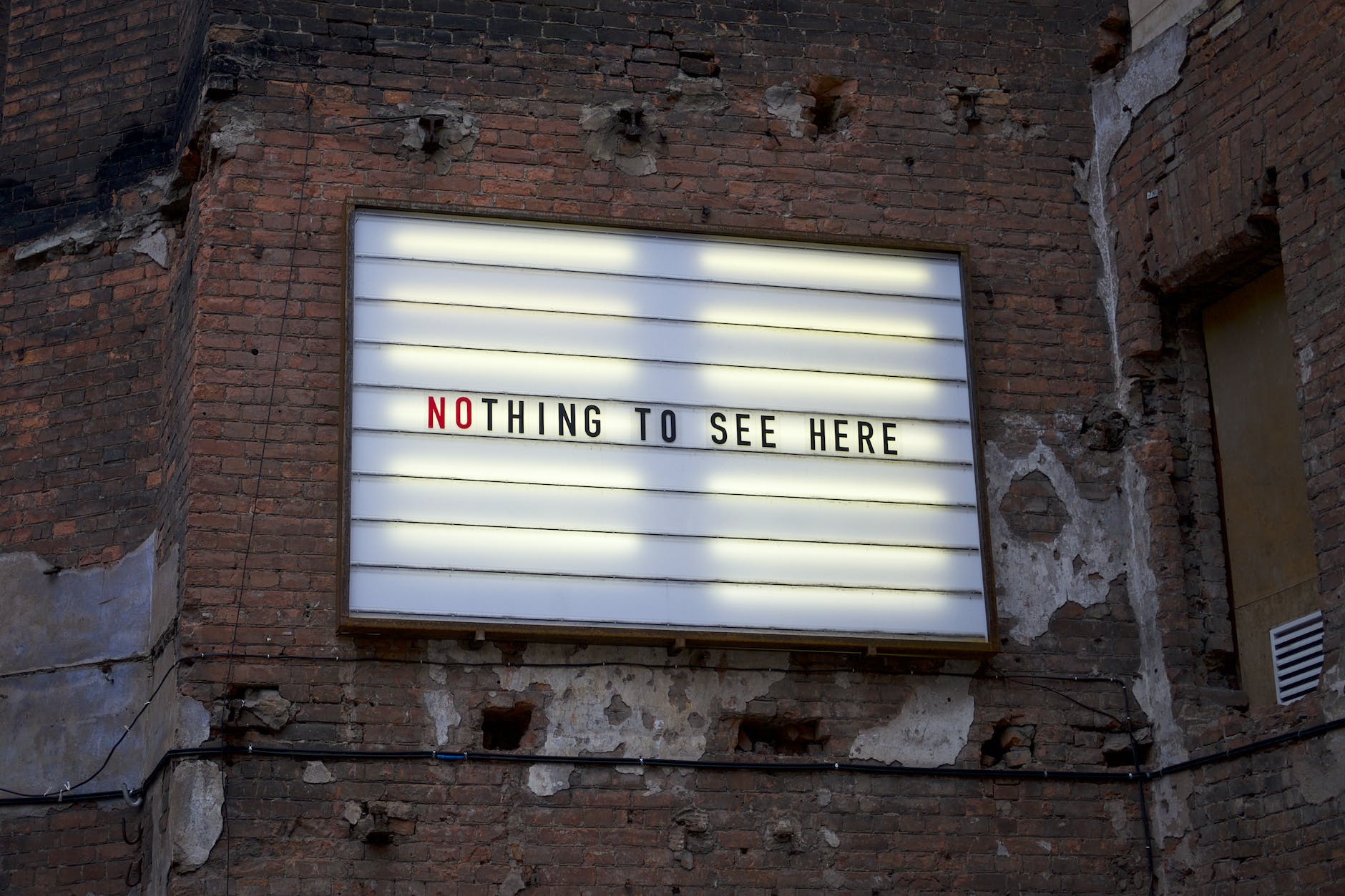- 학교 근처의 모 기록관. 공문을 보내면 수수료를 감면해 준대서 공문을 보냈더니, 딴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기관 대 기관의 공문이라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나는 “박사논문을 쓰는 중이고, 읽을 자료를 그걸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한참의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 피곤해,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건지) 내가 그저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고 이 공문을 보냈다는 걸 자각한 그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떠올렸네요”라 말했다.
- 같은 곳. 열람실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청구서를 출력해 보내주세요”라 말하고,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열람은 직접 가서 청구하셔야 하지, 지금처럼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는데, 누굴 따르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지.
- 모기관. 생산기관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제공하는 기관에서 아직 미이관 기록 혹은 이관 중인 기록이 있는 경우, (말하자면 목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 않나? 서면 혹은 전화로라도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겠지만, 맥락정보가 다 빠진 생산기관, 생산년도, 철제목만 적힌 목록을 받아들면 굉장히 당황스럽다. 일부 철의 경우 묶일 당시의 이름으로 생산자를 묶었던 당황스런 전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현재 확보한 기록물철 목록만으로 그 생산기관과 내용을 파악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때문에 내가 신청한 것 중 어떤 것을 받은 건지 애매 판단하기도 애매하다. 그렇기에 아카이브즈는 연구자들에게 자세한 추가 정보(그들이 말하는 맥락정보)가 담긴 것을 제공해야 하며, 연구자도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과정이 있어야 연구자가 기록물의 열람계획을 세우며 조사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내가 직접 전화해서 공개한 것의 상태와 사정을 물었다. 쓸모있는 이야기는 없었고, 여전히 이상하게 묶인 철의 생산처는 “상상”해야 하는 걸로 남아있다.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걸로… 이럴 거면 청구 왜 한거야…
- 또 다른 기록관. 특정 생산부처의 기록물 목록을 청구하며, 시기를 이승만-김영삼까지로 제한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 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 사정을 한다. 기록관 전체에서 상당량의 기록물철에 대한 것이라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박정희-노태우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곳의 경우 사정을 명확히 말해줬고, 서로가 가능한 지점을 정해나가서 신청자(민원인?)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왜 아카이브즈들은 기록물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공하지 않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기록물철에 대한 별다른 기술없는 목록이라도 제공해주지 않는 건지 의문이다. 이용자에게 검색도구 이용을 유도하려는 이유는 뭘까? 윕페이지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기록물철목록을 담은 엑셀서 검색을 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든 요즘인데, 어차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못할?) 바엔 목록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들 입장에서야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 고루한 곳이나 세련된 곳이나 내게 큰 차이는 없다. 내 입장에서야 행정의 수고와 열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곳이 좋은 아카이브즈일텐데, 모두가 행정기관의 일종이기에 행정에서 오는 수고를 줄여주는 곳은 없다. 카탈로그가 없고, 기록물의 분류가 각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서 목록도 큰 의미가 없으니 어차피 다 읽어야 하므로, 열람의 수고가 덜한 곳도 없더라. 경험상 일처리가 좋은 건 (온라인으로만 자료를 제공하는) 대전의 모 기록관이다. (열람도 나쁘지 않았다. 좁아서 그렇지…) 다른 곳들은 비등비등허다.
-
(지루하고 힘빠지는) 아카이브즈 이용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