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은 책: 조한혜정 외, 『노오력의 배신』, 창비, 2016.
게재: “또 하나의 빈자리를 보라“, 2016년 6월 13일, 『동국대학원신문』.
IMF 위기가 몰아치던 시기, 중학생인 나와 친구들의 교실에는 침묵이 가득하였다. 누군가는 원조교제를 이유로 제적당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모와 함께 야반도주하여 사라졌다. 소문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교실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힘겹게 고등학생이 되었다. 수업시간이 끝나면 야자가 시작하는, 그 지옥같은 생활에 나도 끼어들었다. 한 반에 대여섯명은 윗층에 있는 (우등반) 열람실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몇 자리가 빈 교실에서 야자를 하였다. 핑계를 대고 도망칠 필요도 없었다. 교사들은 윗층에 배치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또 학원에 간다는 아이들의 빈자리도 있었다. 교실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물론 중학교 때와 이유는 달랐지만, 교실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대학이라면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를 건 없었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자면) ‘삼류’ 대학생인 게 싫다며 수능을 보거나 편입을 이유로 떠나갔다. 자연스레 졸업을 하는 친구들의 빈자리는 차라리 나았다. 취업을 한 친구들 가운데 하나는 무지막지한 업무 탓인지 아예 세상에서 제 자리를 스스로 지워버렸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무언가에 아스러졌다. 나는 빈자리를 보며 자라왔다. 자리를 비운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더 앞으로 뛰어나가려던 녀석이었거나, 사회에서 쓸모없다는 취급을 당한 녀석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IMF와 2000년대의 불황을 겪은 특정 코호트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저 삶을 사는 처지 때문인지, 『노오력의 배신』(창비, 2016)은 자주 내뱉는 입말에 대한 좋은 설명서이자 정리서로 읽힌다. “노답”, “-충”, “난민신청할까”. 친구와 몇 해전부터 나누어와서, 이제는 말하기도 서글픈 수다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하고 말이다. 저 수다를 나누던 때, “리드하라”니 “절대지지 않기를” 바란다느니 류의 “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았고 자기계발이 새로운 자격이자 취미가 되었다. 이쯤되니 (선배격인) 지식인과 사업가와 정치가가 사회에 대한 이견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딱히 없었다. 사회라는 장소와 정치라는 장소는 이때쯤부터 작동을 멈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노답”이니, 쟤들은 “-충이니”. 그리고 “난민”이 되는게 낫겠다는 반농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최근엔 헬조선이라는 거대한 세계관까지 만들어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다른 숙제가 찾아온 셈이다. 더는 사회가 인민을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보호하지 않는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질러야 하는 상황이랄까.
그런데 말이다,『노오력의 배신』(창비, 2016)이 말하는 인민이란, 고등학교 시절 야자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처지가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된다. 제목에 대한 생각을 늘어놓는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노오력해보니 (한국사회에) 배신당했다는 말이 아닌가. 배신을 당한 건 ‘나’이자 ‘청년’이라는데, 한국사회가 배신한 걸까? 좋은 미래가 있을거라는 신화에 배신당한 건 아닐까. 이 상황을 인정해야지 한다. 그때에야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해진다. 신화를 잠재우고 일상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쉬고, 모이고, 즐겁고, 배우는 시도들이. 허나 감정적 소비에 그치면 달라지는 건 없다. (쉽게 벗어날 수 없지만, 때때로 유용한) 제도와 자본을 영악하게 바라보는 깡다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인 건,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좋으면 좋은 거고 망해도 괜찮은 일상으로 만든 사회를 꿈꾸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지망생인 나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지금껏 외면당한 자리를 살펴하자고 권하고 싶다. 내가 중학교에서 목격한 빈자리, 쓸모없다는 취급을 당한 사람들의 비루한 자리. 이 자리에 흔한 저 “입말”도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 전, 이 빈자리의 그들 가운데 하나일 법한 사람을 만났는데 되려 ‘배신당하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단다. 사회는 항상 글러먹었으니까 그런 ‘신화’를 가질 수도 없다고. 빈 자리를 다시 보자, 이제 ‘청년’의 범주를 다시 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성공한 자들과 배신당한 자들, 그들 아래에 깔린 자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담에 놓인 숙제란 깔린 자들이 사회 안에서 한데 모여 마주 앉을 마음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배신당한 적 없다’는 말 뒤편에 놓인 빈자리의 삶을 살펴보자. 한데 모이면 괜찮은 미래가 있을지 모르잖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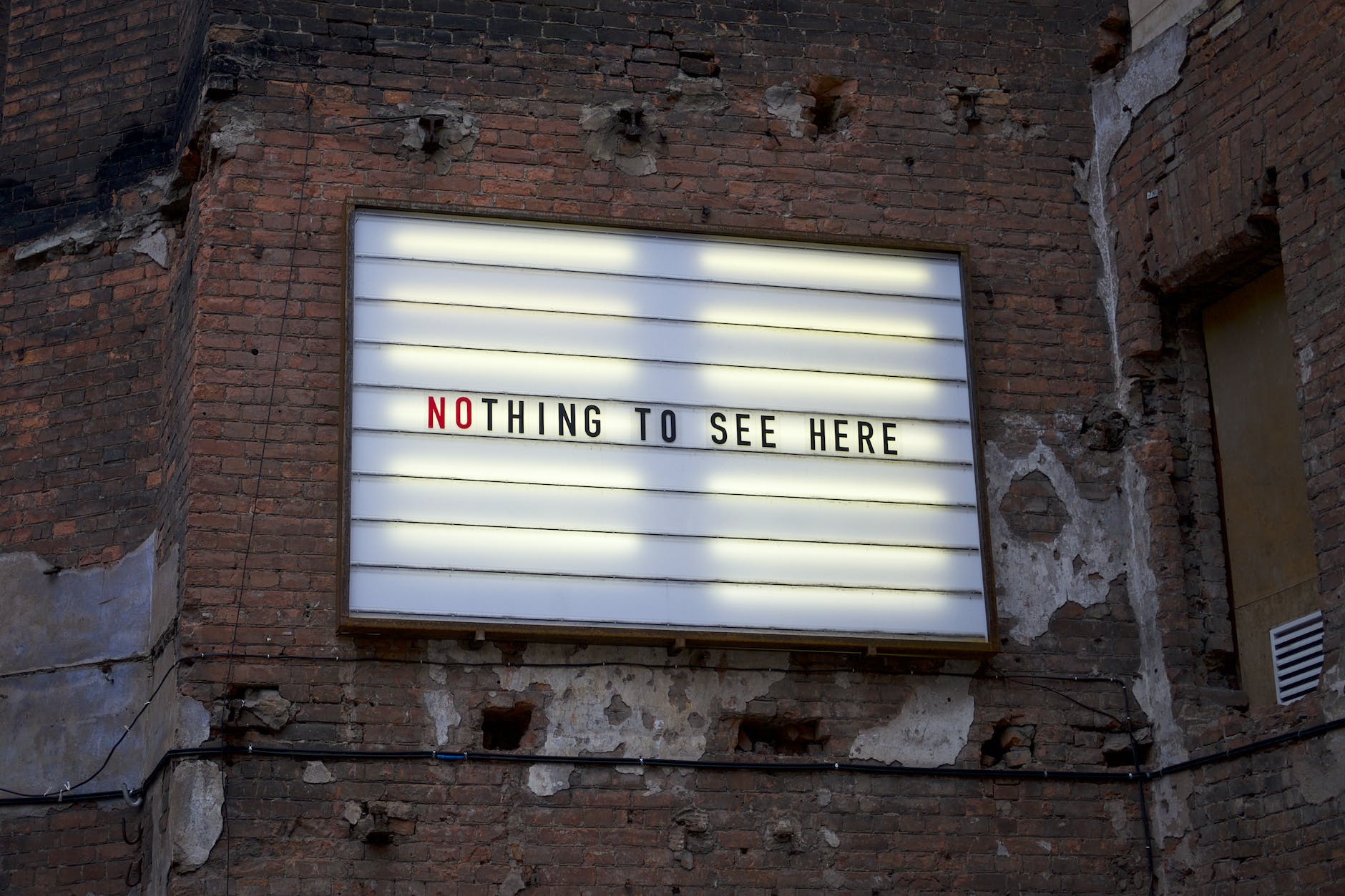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