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뉴스레터도시연서 2017/8에게재한 “도시단신“입니다.
성매매는 근래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보면 꽤 오래된 문제다. 국가의 입장에서란 파악되지 않는 ‘불법인 경제행위’이며, 윤리적인 혹은 규범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며,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다. 도시에서의 성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 업주 그리고 단속주체의 전략이 끊임없이 변하기에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 중 하나다. 이중 정부는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기,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을 통째로 재개발하며 몰아냈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외곽 지역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를 가하며 규제했다. 2000년대가 지나자, ‘성매매 특별법’을 가동하고 일부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요사이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재개발로 인한 차익이 성매매 업소 유지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돈 많은 이들과 일부 업주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며, 오래된 형태의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성매매가 사라진 건 아니다. 업주들은 새로운 운영전략을 고안했다. 이전처럼 고정된 장소에 업소 밀집지역을 만들지 않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시설이나 주택에 은밀히 (그리고 유동적으로) 자리한다. 거리를 걷거나 (대개는 남성의) 공중화장실에 꽂힌 ‘명함’ 형태의 성매매 업소의 광고물, 혹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성매매’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가 접근하게 한다. 성매수자가 이 광고를 보고 ‘예약’하며, 고지한 장소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다른이의) 성을 ‘매수’하게 한다. 업주는 ‘인증’이라는 성매수자로부터의 보호 전략도 고안해냈다. ‘관리자’ 혹은 ‘성매도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의 행동강령은 이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못 우스운 가십거리로 보이지만, 업주가 고안한 나름의 자기보호 전략이다. 옳은 전략을 세웠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인 성착취를 강요하는 업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이를 ’강령’으로까지 ‘숙지’해야 하는 성매도자의 다급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도 새 전략을 고안했다. 기존의 단속/처벌과는 다른 방식이다. 디도스 방식이란 별명이 붙은대로, ‘예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업소의 전화통에 자동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성매수자와 업주 사이를 방해하는 전략인데, 수집한 모든 번호를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프로그램이 수집된 업자의 번호에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전략이 성매매를 사라지게 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성과를 운운하는 일도 우습다. 아마, 업주들은 또다시 새 전략을 찾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예약은 막을 수 없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런 전략의 변화 과정에서도 빠진 게 하나 있다. 업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가운데 그 무엇도 ’성매도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성매도자’를 ‘불결한 존재’라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성매수자의 ‘성’에 대한 허튼 관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돈 주고 섹스는 했지만 성경험은 아니라는 허튼 소리, 이런 말은 ‘관용’적인 사회 때문이 아니라 ‘성매도자’ 역시 나름의 삶을 사는 인간이란 생각조차 없는 자로부터 떠도는 소리다. 성을 매수하는 내가 있어서 성매도자가 살아간다,는 어이없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성매매를 문제로 파악한다면, ‘성매도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며, ‘성매도자’ 역시 사람 ‘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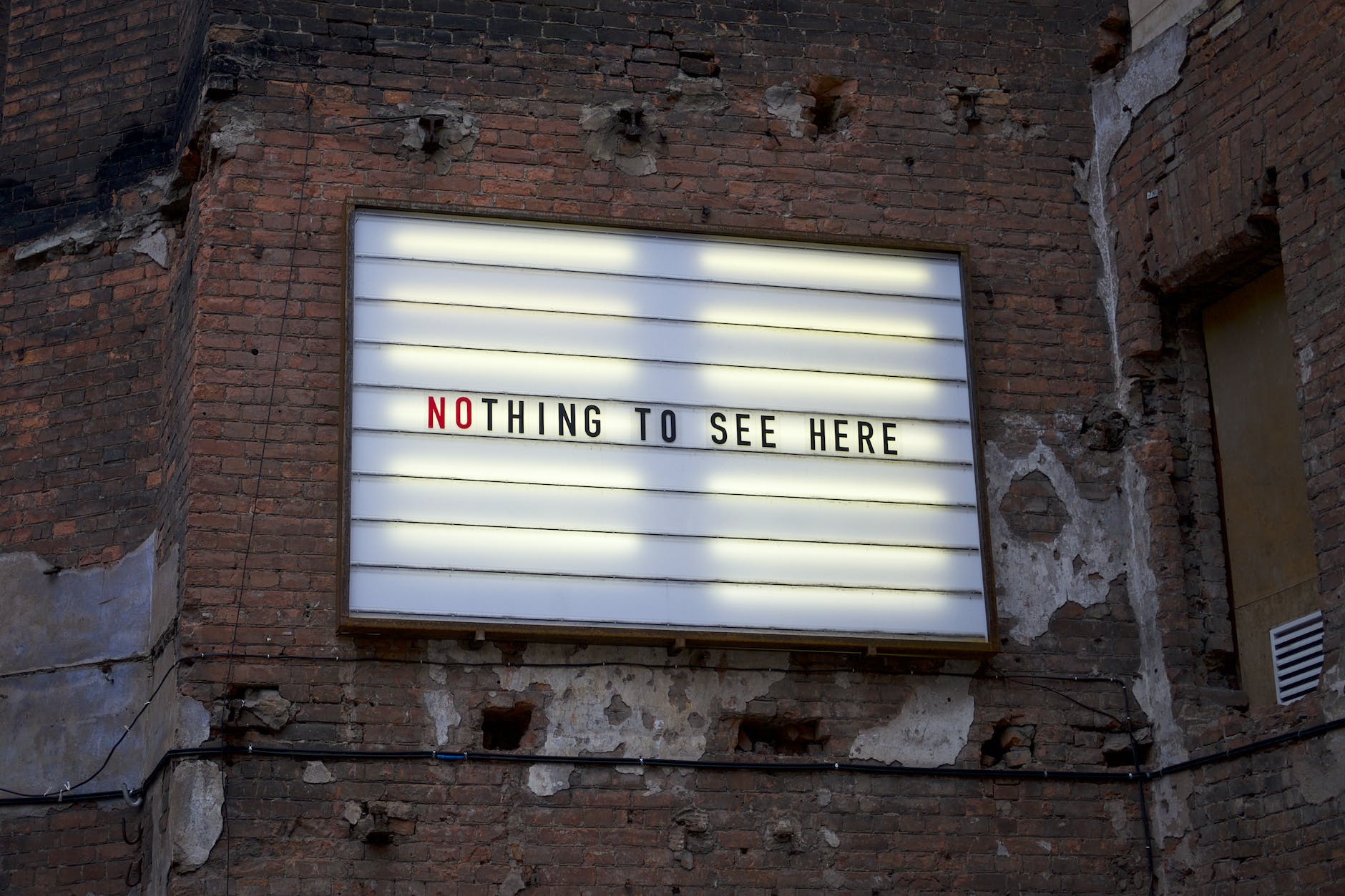
댓글 남기기